"시신 350구 해부하니 삶 보여" 의대 6년차 이 남자가 간 곳
[백성호의 현문우답]
코로나 공포의 뿌리는 결국 죽음
번뇌를 지혜로 바꾸는 계기 삼자
자신에게 솔직한 삶에 희망 있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죽음을 외면하면서 사는 삶,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의 바람은 차가웠다. 그곳에 있는 도전 돌밭공동체에서 서명원(67) 신부를 만났다. 캐나다 출신이면서 예수회 신부인 그는 지난해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했다. 지금은 공동체 도반(道伴)들과 함께 유기농 농사를 손수 지으며 명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서 서 신부에게 ‘코로나, 그리고 삶과 죽음’을 물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이도 많고, 확진을 당해 병마와 싸우는 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 감염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 :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더구나 매주 벌어서 매주 먹고 사는 분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자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삿대질하며 큰소리로 야단을 치더라. ‘다들 두려워하는구나’ 싶더라.”
Q : 감염에 대한 두려움인가.
A : “결국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게 코로나 공포의 뿌리다. 그런데 그 공포에만 젖어서 살면 어떻겠나. 삶이 더 우울해지지 않겠나. 불교에서는 ‘번뇌가 보리(菩提ㆍ깨달음의 지혜)’라고 말한다. 그러니 ‘코로나’라는 번뇌를 삶의 지혜로 돌리면 좋겠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코로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다. 그걸 어떻게 지혜로 돌리나.
A : “가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나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럼 열에 아홉은 ‘없다’고 답한다. 왜 그럴까. 다들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일이라고 여긴다. 나도 그랬다.”
서 신부는 예수회 사제가 되기 전에 의대생이었다. 600년 전통의 프랑스 보르도대학 의과대를 6년간 다녔다. 여름방학 때는 고향인 캐나다 퀘벡주로 돌아갔다. 그리고 몬트리올 성모병원 지하 해부실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사실 의대를 다녀도 시신 해부 기회는 드물다. 저는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5년간 시신 350구를 해부했다. 해부 첫날을 잊을 수가 없다. 시신이 살짝 부패했는데도 내장에서 나오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시신 해부를 10구, 20구 나중에는 100구, 200구를 해도 죽음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죽음은 언제나 남의 것, 나와 상관없는 것이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죽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지 않았나. 그런데도 왜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는 못했나.
A :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가 있었다.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다. 당시 한 유대인이 독가스실로 유대인들을 넣은 뒤 가스 밸브를 여는 역할을 했다. 그 사람이 목격한 죽음이 얼마나 많았겠나. 그는 죽음의 도가니 속에 있었다. 그런데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인간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
Q : 신부님은 그런 생각이 언제 깨졌나.
A : “하루는 해부실에서 시신들을 둘러봤다. 꼬마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말이다. 그때 불현듯 나도 죽는다는 사실이 실감 났다. 비로소 나의 죽음을 직시하게 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그걸 받아들였더니 무엇이 달라졌나.
A :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수용했다. 그랬더니 그다음 물음이 올라오더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유한한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건 내면의 소리였다. 나는 이걸 ‘내 마음의 GPS(위성항법 시스템)’라고 부른다. 그때부터 GPS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의대 6년 차 때 그는 보르도에서 기차로 8시간이나 떨어진 리옹의 수도원으로 갔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8일간 피정을 하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싶었다. 8일째가 다가올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결국 그해 여름에 의대를 자퇴하고, 가을에 프랑스 예수회 수도원에 입회했다. 물론 부모의 반대와 비난은 굉장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의대에 보내지 못해 안달이다. 신부님은 어렵게 들어간 의대를 스스로 포기했다. ‘내면의 소리’를 따라온 삶,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
A : “외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의사였다. 어머니는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고자 했다. 굉장한 ‘헬리콥터 맘’이셨다. 남동생 하나는 의대 합격이 충분히 가능한 점수를 받은 날, 청산가리를 먹고 지하실에서 자살했다. 의사는 어머니가 원하는 삶이었으니까. 또 다른 남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의사를 그만두었다. 이제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 내게 '나도 형처럼 살걸'이라고 말했다. 그럼 나는 어떤가. 의대생 때는 ‘부모님이 바라는 나’로 살았다. 지금은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살고 있다. 이보다 큰 행복이 있겠나. 의사로 살았다면 나는 분명 불행해졌을 거다.”
Q : 우리는 왜 ‘나의 죽음’이나 ‘삶의 지향’에 대해 그다지 생각해보지 않는 건가.
A :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문명은 그걸 쉽게 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그걸 찾게 하기보다 온갖 물건에 대한 소비자로만 만든다. 파리나 뉴욕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브랜드의 외제 차를 타고, 더 좋은 컴퓨터와 더 좋은 향수, 더 좋은 옷을 소비하게 한다. 그걸 통해 삶의 만족을 찾으라고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행자가 아니라 소비자로만 살게 된다.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내 안의 소리를 다시 들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A : “생활의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나를 일깨우는 가르침을 접해야 한다. 나는 그걸 '고전'이라고 부른다. 불교의 명상법도 될 수 있고,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의 철학도 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도 좋고,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도 좋다.”
Q : 그런 고전을 읽기만 하면 되나.
A : “아니다. 그 고전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화해야 한다. 본래 뜻에 최대한 가까이 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
Q : ‘나의 죽음’에 대한 깊은 직시가 오히려 삶의 의미를 묻게 했다. 그게 내 마음의 GPS를 작동하게 했나.
A : “그렇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 19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다들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나.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나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럼 코로나라는 번뇌를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 보고 싶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게 왜 중요한가.
A : “공자도, 노자도, 예수도, 부처도 한결같이 말한 게 있다. ‘솔직하게 살아야 한다’.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게 뭔가. 솔직하게 사는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일이다. 그게 얼마나 희망찬 인생인가.”
인터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눈발이 펄펄 날렸다.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고, 겨울이 있어야 봄도 있다. 꽁꽁 언 밭고랑, 그 아래에서 봄은 이미 올라오고 있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주=백성호 종교전문 기자 vangogh@joongang.co.kr
■ 서명원 신부는 누구인가
서명원 신부는 캐나다 퀘벡주 출신이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다.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호적에도 ‘서명원’이란 이름을 올렸다. 불어 이름은 베르나르 스네칼이다. 예수회 소속의 가톨릭 신부이면서도 30년 넘게 간화선 수행을 하고 있다. 파리 7대학에서 성철 스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 신부는 “저의 중심은 그리스도교다. 그렇지만 불교로 인해 제 종교와 영성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고 말한다. 1979년 예수회에 입회했고, 85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다종교 문화권을 접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금은 경기도 여주에서 농사와 영성을 병행하는 도전돌밭공동체를 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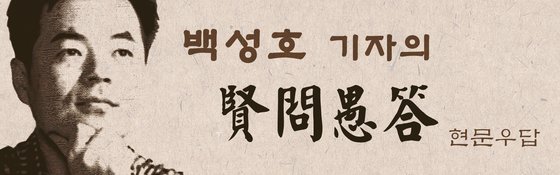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