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너무 가까워서 이해하기 힘든 존재
 |
자비에 돌란은 천재 감독으로 통한다. 19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그는 이제 고작(?) 스물일곱 살의 나이에 무려 6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중 <마미>(2014)와 <단지 세상의 끝>(2016)이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젊은 거장의 지위를 얻었다. 더 놀라운 건 자비에 돌란이 연출 편수를 더 할수록 더욱 넓어진 시야를 과시한다는 데 있다.
<단지 세상의 끝>은 프랑스 출신의 극작가 장 뤽 라갸르스의 동명 희곡을 영화로 옮겼다. 12년 전에 떠난 루이(가스파르 울리엘)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오랜만에 집을 찾은 아들을 위해 엄마(나탈리 베이)는 정성껏 요리를 준비한다. 여동생 쉬잔은 별 기억이 없는 오빠가 유명작가가 되었다니 호기심에 들뜬 심정이다. 하지만 형 앙투안(뱅상 카셀)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얼굴이 편치 않다. 그러거나 말거나, 앙투안의 아내 카트린(마리옹 코띠아르)은 처음 만나는 루이를 반갑게 맞이한다.
루이가 집을 찾은 건 이유가 있어서다. 그동안 못 본 가족들이 그리워서라기보다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다. 루이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말을 꺼내기도 전 엄마와 쉬잔과 앙투안과 카트린은 자기 말만 쏟아내기 바쁘다. 재회의 반가움도 잠시, 이들의 말 중 상당수는 루이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대한 루이의 반응은 뜻밖에도 순응이다. 가족의 독기어린 말들을 예상했다는 투다. 결국, 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집을 떠난다.
12년 전 루이가 왜 가족을 떠났는지, 그동안 왜 한 번도 집을 찾지 않았는지, 앙투안은 왜 그렇게 동생에게 화가 났는지 등 영화는 전쟁 같은 이들 가족의 말싸움 중 탄피처럼 무수히 떨어지는 ‘왜’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하지 않는다. 자비에 돌란이 보기에 가족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서로에게 온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하는 피붙이의 총합이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늘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는 돌란이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특별한 시선도, <단지 세상의 끝>의 루이 가족이 겪는 특수한 경우도 아니다.
 |
우리 대부분은 매일 같이 가족과 함께 좁은 집에 모여 지지고 볶고 산다. 혼자 사는 경우라도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집을 찾기 마련이다. 그때 벌어지는 상황은 <단지 세상의 끝>에서 루이가 맞닥뜨린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가운 인사말이 오가다가도 그동안의 섭섭한 감정을 쏟아내다 보면 좋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없고 남의 눈 의식하지 않는 고성과 무거운 침묵이 재회의 기분을 망치고 만다.
가족 간 불화에 방아쇠를 당기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자 정서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을 경우 피해자 정서는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간다. 오로지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문제는 해결은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긋는다. 그것은 꼭 옆의 시야를 가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자비에 돌란 감독이 <단지 세상의 끝>에서 주목하는 촬영기법은 ‘클로즈업’이다.
클로즈업은 촬영 대상에 근접해 촬영하는 기법을 말한다. 인물을 클로즈업할 경우, 해당 인물의 감정이 극대화되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 인물의 심정이나 기분은 의도적으로 배제되기 마련이다. <단지 세상의 끝>은 루이가, 앙투안이, 카트린이, 쉬잔이, 엄마가 묵은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말문을 열기만 하면 어김없이 클로즈업을 활용한다. 이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단지 세상의 끝>은 이들 가족을 함께 잡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렇게 가족은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이해 받지 못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피해자 정서가 충돌하는 가족의 삶은 각자에게 수난사다. 그 수난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그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루이는 그게 싫어 12년 전에 가족을 떠났고 이번에는 그마저도 감수하기 위해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시 떠나는 길을 택한다. 그건 가족에 대한 체념일까? 아니면 곧 다가올 죽음으로써 행하는 가족을 향한 복수일까? 알 수 없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판단이 어려운 존재다. 떠났다 돌아왔다 다시 떠났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맺는 가족의 관계, 그건 연어의 회귀본능과는 다른 인간의 본성이다.
자비에 돌란은 데뷔작 <아이 킬드 마이 마더>(2009)부터 가족을 다뤄왔다. 더 정확히는 가족 같은, 연인 같은, 적수 같은 엄마와 아들의 사연에 집중해왔다. 자비에 돌란은 실제로 자신이 엄마와 맺었던 관계를 영화로 드러내며 가족 관계를 정의해왔다. 산전수전 다 겪은 감독도 쉽지 않은 주제를 20대의 감독이 정면돌파하니, 사람들은 자비에 돌란을 향해 ‘앙팡 테리블’, 무서운 아이라 평했다.
이제 그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 가족을 이야기한다. (돌란의 영화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대개 부재하다. 이에 대해 돌란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별 추억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전 영화들이 감독 본인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연의 성격이 컸다면 <단지 세상의 끝>은 좀 더 보편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럼으로써 관객을 영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자비에 돌란의 진화하는 연출의 끝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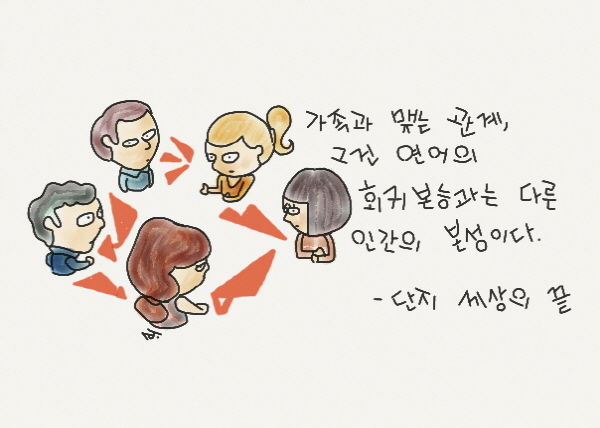 그림_허남준 |
글 | 허남웅(영화평론가) 사진 | 허남준(그림)
추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