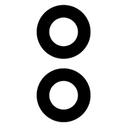『행복의 디자인』 반려의자
“당신을 위해 비워두었어요”
 Photo by Lee Jaehyun |
상상의 발견으로부터 사물의 기원을 추적하는 장 그노스Jean Gnos는 『인간과 사물의 기원』에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말한다. ‘개와 의자의 기원’에 관한 다소 황당한 이야기로, ‘세 발이어도 서 있기에 부족함이 없던 의자가 네 발이 된 건, 순전히 인간과 개 사이에 싹튼 우정이 부러워서였다.’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다.
인간과 친구가 되기를 바랐다면 차라리 두 발로 서고 걷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의자는 개를 대신해서 오히려 네 발이 되기로 하고, 스스로 인간 곁을 지키기를 택했다는 이 재미있는 상상. 아마도 이 상상의 기원이 사실처럼 와 닿는 건 역사상 의자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고대 이집트의 왕좌 때문일 것이다. 왕좌의 그 늠름한 모양새는 마치 충직한 모습의 네 발 달린 짐승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다소 엉뚱하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의자와 인간 사이에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각별함’이 느껴져서이다. 원래 세 발이었던 의자는 개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염원으로 반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내며 마침내 네 발로 진화했다. 아마도 의자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세 발도 아니고, 고작 두 발로 스스로를 지탱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 인간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자 숙명이었을 것이다.
 |
이 상상의 기원 속 의자가 실제로 생겨난 건 약 4,800년 전으로 추정되지만 누구에게나 편히 쉴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불과 300년도 되지 않는다. 그것도 초기에는 계층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기댈 수 있는 긴 등받이와 팔걸이를 갖춘 안락한 의자armchair는 주로 특권 계층에게만 허락되었다.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자라고 해봤자 여럿이 함께 앉는 긴 공용 의자settle, bench나 등받이 없이 앉을 수 있는 스툴stool 정도였다.
좌식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의자를 사용했던 옛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의자는 귀한 물건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7년에 귀빈이나 사신에게 내리는 하사품으로 벼슬아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했던 접의자胡床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의궤도'에도 왕의 모습을 대신해 왕좌를 그려 넣어 귀한 신분을 의자로 상징했었다. 이처럼 의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기능과는 별개로 소유자의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사물로 여겨졌다.
의자가 대중화된 건 산업혁명 이후이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네 삶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대량생산으로 인해 누구나 의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의 배경에는 법랑이나 알루미늄, 플라스틱과 같은 신소재들의 등장이 있었다. 디자인은 이 소재들을 혁신적으로 사용하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자유분방하고 실험적인 의자들을 탄생시켰다. 그 파장은 의자의 세계에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의자라고 믿어왔던 형태를 철저히 파괴한 의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가장 완벽한 의자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자노타Zanotta사의 사코Sacco가 대표적인 예이다.
1968년 등장한 ‘부대자루’라는 의미의 콩 주머니 의자 사코는 인조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자루에 합성수지 알갱이가 충전된 형태로 팔걸이도, 네 개의 다리도 없지만 기꺼이 ‘앉을 것seats’이 되어 주었다. 이 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의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자가 사람의 자세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한다는 데 있다. 물렁물렁하고 형태도 없는, 이 의자답지 않은 의자는 그 누가 앉더라도 앉은 이의 자세를 완벽하게 흉내낸다.
 Sacco Chair, 1968 Design by Piero Gatti, Cesare Paolini & Franco Teodoro for Zanotta Image from Vitra Design Museum |
사코 의자는 정통문화가 지닌 엄격한 미의 가치에 대항하는 반문화 시위가 빈번했던 1960년대. 그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이탈리아의 세 디자이너, 피에로 가티, 체사레 파올리니, 프란코 테오도르에 의해 탄생했다.
 Photo by KEVIN BYRD |
반듯함보다는 흐트러짐을, 침묵보다는 대화를, 고이 모셔두기보다는 장난감처럼 놀아주기를 은근히 설득하는 것이 사코가 바라는 것이다. 사코의 탄생 이후, 의자는 하루 여행자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나머지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인간의 사려 깊은 반려 존재로 부상했다. 의자에 앉으면 사람들은 좀 더 솔직해지고 여유로워지며 느슨해진다.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면 의자에 기대어 울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실컷 분노하기도 하고, 행복하면 깔깔거리고 활짝 웃으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다. 가던 길이 힘들면 쉬어 가기도 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앉은 이들과 이야기 나눌 여유도 부린다. 사코는 비록 팔도 다리도 없는 의자지만, 네 발 달린 개처럼 인간의 반려가 되기를 원했던 의자에 대한 상상의 기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약간은 불안정하고 불편해 보이는 인간의 두 다리를 편히 쉬게 해주는 의자. 어떤 것은 몸 전체를 편히 해줄 수 있는 등받이를 갖추고 있고 어떤 것은 푹신한 쿠션으로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한다. 어떤 형태로든 의자는 우리를 쉬게 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의자는 감히 ‘반려’ 라는 단어를 동반할 자격을 갖춘다.
 Photo by KEVIN BYRD |
창 밖으로 천천히 기울어져가던 해가 다시 돌아보니 사라지고 없었다. 오후 6시, 떠나야 할 시간이다!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다. “퇴근합시다!” 하루의 4분의 1만 남은 시간, 이 시간은 좋은 이와 식사를 즐길 시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반길 시간 그리고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어 저무는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다. 오후 6시, 의자로부터 벗어나, 편안함을 위해 비워둔 반려의자를 향해 떠날 시간이다.
 6. p.m. Chair Design by Christian Vivanco www.christianvivanco.com |
 YOY Canvas Chair, 2013 Design by YOY Photo by Yasuko Furukawa www. yoy-idea.jp |
바라보기, 대화하기 그리고 다가가서 경험하기. 사물과의 관계가 각별해지는 때는 상상하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때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동굴 속이 아닌 의자 속으로 빠져든 것처럼 다가가서 손을 뻗으면 캔버스 위의 의자 그림은 진짜 의자가 된다.
 Design by Yvonne Fehling and Jennie Peiz Photo by Horst Bernhard, Hardheim, Germany www.fehlingpeiz.de |
“Stuhlhockerbank”는 사용자가 공공의 공간에 접근하는 특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의자와 스툴 그리고 벤치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이 의자를 마주하는 사용자는 ‘앉을 것’이라는 의자의 목적성을 뛰어넘어 사물로 인해 달라지고 변화하는 스스로를 경험한다. 들쑥날쑥 제 멋대로인 것처럼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한 몸의 의자는 색다른 친근함과 재미를 준다. 일상은 숲 속의 왈츠처럼 감각적이고 시적인 리듬에 휩싸인다. 의자는 때론 인간을 춤추게 한다.
 Design by Yvonne Fehling and Jennie Peiz Photo by Horst Bernhard, Hardheim, Germany |
한 가족이나 동료들을 위한 길고 폭신한 소파는 흩어진 가족과 친구들을 한데 모으고 이야기 꽃을 피우게 한다. 책상 옆에 놓인 여분의 간이 의자는 오고 가는 이들이 잠깐 멈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한다. 바퀴가 달리고 등받이가 휘는 사무용 회전의자는 피로에 지친 이들이 기지개를 펴고 빙그르 돌리며 창 밖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게도 한다. 앉는다는 것, 그것은 흐르는 시간을 느끼며 공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다. 의자는 이미 우리에게 부여됐지만 종종 잊고 사는 생각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노라 상기시켜주는 ‘ 생각 시계’인 것이다.
1년. 12달. 52주. 365일. 8,760시간. 525,600분. 불완전한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크고 작은 산등성이와 강을 넘는다. 함께여도 혼자인 것이 삶이라고 하지만 혼자라고 느낄 때 마주하는 의자는 험난한 길의 동무가 된다. 삶이라는 여정의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넓은 세상에 아주 잠깐이라도 기댈 곳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마음이 닿는 어딘가엔 항상 사려 깊게 만들어진 의자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늘 디자인을 만난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곧 디자인의 행복이기에.
* 위 칼럼은 『행복의 디자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글_ 김지원, 정리_ 김소영
저자 소개 김지원
디자인의 시작과 끝 사이의 모든 과정을 보여 주려는 마음은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도, 어떤 과정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야 비로소 정성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람을 위한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면서, 사물을 만드는 이의 정성과 쓰는 이의 애정이 비례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뭐든 쉽게 만들고, 또 버리고 부수기를 반 복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깐깐함’과 '정성'은 디자인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 한의 윤리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모닝글로리 디자인연구소 팀장을 지냈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디자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런던에서 돌 아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개발팀장을 지낸 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학교부속기관인 '전통문화상품개발실'의 초대 디렉터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재직 중이다. 저서와 논문으로는 『런던 디자인 산책』, 『메타상품으로서 문화상품(2014 한국디자인학회 최우수논문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