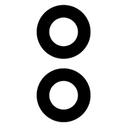런던에서 디자이너로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만난 앨런Alen이라는 친구가 있다. 대만의 전자공학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던 그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 유학생 대부분이 그렇듯, 학위를 얻기 위해 영국 유학을 결심했다고 했다. 그와 나는 어학원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침착한 형 같은 사람이었다. 같은 아시아인인 우리는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기에는 둘 다 영어가 굉장히 서툴렀기 때문에—지금은 영어도 서투르고 한글도 서투른 이상한 상태가 되었다—우리가 나눴던 대화는 대부분 우리가 마주치는 언어의 장벽과 단순히 언어 때문만은 아닌 이 사회와 우리(외국인)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것들이었다.
둘 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날, 그는 어두운 얼굴로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공부하고 있는 공학 분야의 수업은 대부분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그룹 토론에서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예술 대학은 의외로 영어가 서투른 학생들이 많다. 학교에서도 그들의 말하기 실력보다는 작업 자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고, 그런 시각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일종의 배려가 된다. 물론 자신의 작업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대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던 그는 그 토론의 주제가 자신에게 익숙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없게 했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많이 낙심한 듯 보였다.
몇 달 후 통화해 보니 앨런은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이제는 그 막막하던 토론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의 유학생들, 아니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경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진정으로 속할 수 없다는 느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다. (유학생들 중에는 불면증이나 약간의 알코올 의존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나처럼 두 가지 상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늦은 밤 맥주와 함께 키득거리며 보는 <무한도전>이 없었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다.) 갈색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은 붕 떠 있던 나는 앨런이나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때부터 나는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과 외국인으로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런던에서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흔히 마주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을 상징하는 투명한 아크릴판과, 주변의 색과 가장 대비되는 진한 색의 물감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주고,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써달라고 부탁했다.
 |
"런던에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다."
 |
"사람들은 이곳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온다."
 |
"영국에서 외국인이 괜찮은 직장을 얻기란 너무나 어렵다."
 |
"회 먹고 싶어요!"
 |
"버스는 빨간색, 날씨는 회색“
Interview : Why Not Associates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Why Not Associates)는 앤디 알트만(Andy Altmann)과 데이빗 엘리스(David Ellis)가 설립한 그래픽디자인스튜디오다. 1980년대 중반 영국의 기존 그래픽디자인의 틀을 벗어나는 과감하고 실험적인 타이포그래피 작업으로 영국 디자인 언론으로 부터 “타이포그래피계의 거친 소년들(Wild Boys of Typography)”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는 그후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의 경계를 확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중의 하나다. 디자인 잡지 <크리에이티브 리뷰(Creative Review)>는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를 ‘2010년의 베스트 디자인 스튜디오’로 선정하였으며,<디자인 위크(Design Week)>는 이들의 최근 작업 <코미디 카펫(Comedy Carpet)>을“2012년의 베스트 전시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
나는 대학원을 마치고 짧은 기간 동안 와이낫 어소시에이츠에서 인턴 디자이너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나를 포함한 많은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그들이지만, 여전히 어떤 서체를 쓸지, 어떤 레이아웃으로 지면을 구성할 것인지 등의 보통 디자이너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왠지 반가웠다. “거친 소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예전에 만들어 냈던 규정되지 않는 거친 작업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만난 그들은 여전히 새롭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작업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소년들이었다. whynotasoociates.com
기존 그래픽디자인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의 작업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나요?
Andy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칠다든가 실험적이라든가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그 작업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었어요. 특히 학교에서 했던 작업의 대부분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를 실험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 타이포그래피는 항상 디자인 작업의 가장 마지막 단계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모든 이미지와 레이아웃 세팅이 끝난 후에 텍스트가 그 위에 얹혀 지는 방식이었죠. 우리는 그 순서를 바꿔 보려고 했어요. 타이포그래피가 디자인 작업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작업을 원했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이미지 메이커들과는 절대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작업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타이포그래피만으로도 작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엔 일러스트레이터와 많은 협업을 해요. 아마도 ‘재미있는 부분을 꼭 내가 해야 한다’는 욕심이 적어진 것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즐거워졌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요즘의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는 스타일이 가장 없는 디자인 스튜디오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업이 정말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에서 한거야?” 싶은 작업도 많이 해요. 예전에 가졌던 고집이 많이 약해진 탓이겠죠.
사실 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가 했던 작업 중 그 당시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를 소재로 한 포스터 작업을 봤어요. 그런 정치적인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학교의 반응은 어땠나요?
David 그 부분이 바로 ‘대학 교육이 지닌 미덕’이죠. 최소한 학교에서는 상업적인 작업이 아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정해 놓은 커리큘럼이 있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개인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가는 일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작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Andy 하지만 졸업 후에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한 증명을 해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 왜 안 되는데? 이 이미지가 뭐가 잘못됐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덕분에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거봐, 내 말이 맞지?”라는 거만한 표정을 지을 때가 제일 흥분됐던 순간이었죠.
 데이비드 엘리스가 RCA 재학 시절 작업한 투표 독려 포스터. 마거릿 대처 수상의 얼굴을 포스터 전면에 넣고, '노동당에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
좋아 보이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본능이 학교 교육을 통해 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이들은 좋은 이미지를 알아보는 본능 없이 태어나는 걸까요?
David 학교는 그런 좋아 보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한 다양한 작업을 경험해 봐야 해요. 드로잉에서 시작해서 콜라주, 사진, 입체작업 등을 통해 그런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학교 교육을 받아야하는 이유에요. 본능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좋아 보이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훈련을 통해 습득해야 해요.
특히 디자이너라면 어떤 종이 사이즈에 어떤 사진이 어떤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책의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편집할 때,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맞아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음, 이거 좋은데?” 하는 순간이요. 그 순간 그 크기의 이미지가 왜 좋아 보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난 그 이유를 왜 굳이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Perspecives iTV 타이틀 시퀀스 |
 Unseen Gaza 채널4에서 방영된 가자(Gaza)지역의 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 오프닝 시퀀스 |
 Tokyo Type Directors club Exhibition 2010년 타입 디렉터스 클럽 전시를 위한 포스터 |
글의 전문은 <런던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글. 권준호